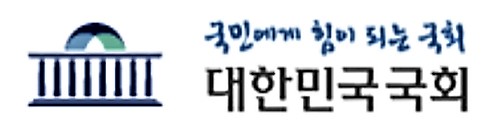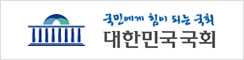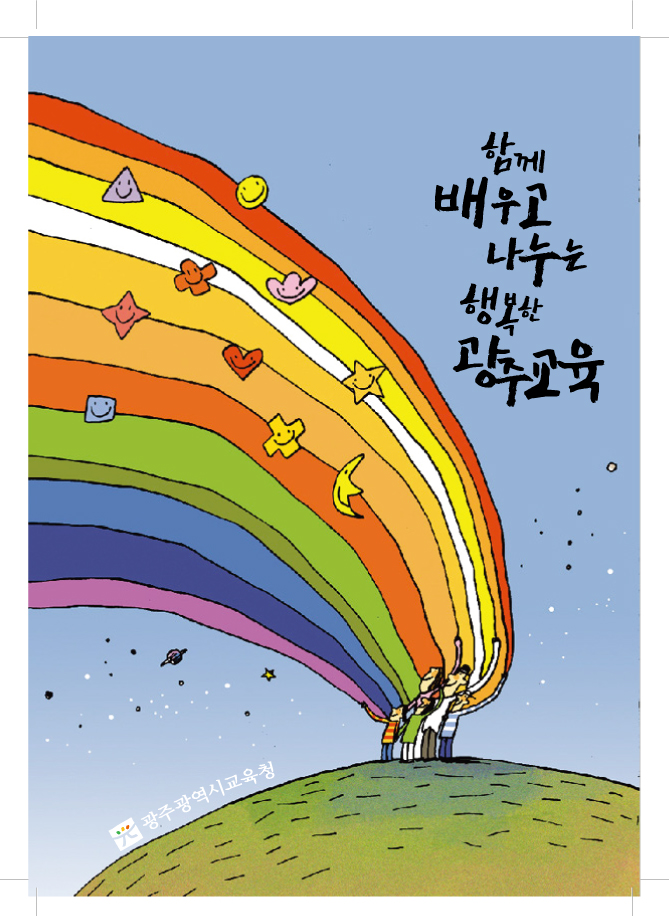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박이도 선생의 시집을 받았을 때다. 선학(先學)의 시집을 받고 송구하여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윤수천 선생의 어머니를 주제로 한 동시집을 받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시를 만나면 감상평을 나누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한다. 괜스레 선학의 시에 상처를 내는 듯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감상평을 쓰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선학이 번역한 책을 읽으며 나름의 판단이 생기더라도 되도록 평론을 유보하려 애쓴다. 시도반에게는 선학을 평론할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성복 선생과 김연수 선생의 번역 시집을 읽을 때도 그랬다.
시도반은 한국 문학을 편애한다. 소설을 읽을 때나 시를 마주할 때도 한국어가 주는 결, 호흡, 숨결을 우선한다. 작가의 문장 맛, 미세한 리듬과 음성이 곧 작품의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문학을 읽을 때면 어딘가 '덜하다'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번역이라는 과정 때문에 원문의 고유한 울림이 희석되는 것은 아닐까, 늘 경계심이 있었다.
그 경계는 문득 허물어졌다. 김연수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으며 생각에 틈이 생겼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읽는 사람이 훌륭하게 읽을 줄 알면, 번역본이고 뭐고 상관없다."
번역서가 원문을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지만 독자의 그릇, 해석 능력, 감수성, 상상력이 충분하다면 번역을 통해서도 시는 온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문장이 생각을 뒤흔들었다.
이후 이성복 선생님의 번역 시집을 보며 번역가는 단지 원문을 옮기는 전달자가 아니라 '다른 언어의 동료 시인'임을 깨달았다. 원시(原詩)의 골격과 번역가의 목소리가 만나 전혀 새로운 시가 되는 순간을 보았다. 그때 알았다. 글의 본질은 ‘누가 옮겼는가’보다는 ‘누가 읽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독자의 품격과 태도, 그것이 글의 마지막 완성이다.
번역을 '원문에서 결핍된 무언가를 보충하는 작업'이라고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다. 번역은 결핍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발명을 한다. 원문의 멜로디를 온전히 옮기는 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번역가는 다른 리듬, 문장 길이, 단어 선택, 이미지 배치를 통해 새로운 울림을 만든다.
파울 첼란의 무게, 폴 엘뤼아르의 산만한 자유, 로버트 프로스트의 절제된 시선, 브레히트의 냉정한 아이러니. 이들의 고유한 음성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은 손실과 창조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고민하는 일이다.
이성복 선생님의 번역(혹은 '시를 붙이는' 행위)은 그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훌륭한 번역가는 원문에 충실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어로 다시 시를 짓는 사람이다. 그는 원문의 결을 존중하되 한국어 독자가 잘못 읽지 않도록 리듬과 호흡을 재설계한다. 번역 시를 읽는다는 것은 곧 번역가의 시와 원시 사이의 혼합형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혼합형을 맛있게 소화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귀는 감고 뜰 수 없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구절은 독자마다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누군가는 단순한 사실로 읽고, 누군가는 소리의 위험성과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 읽는다. 시도반은 후자에 속한다. 귀는 닫을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듣고, 영향받으며 살아간다. 번역 시도 마찬가지다.
독자는 자신이 가진 언어적·문화적 필터를 여닫는 능력이 필요하다. '열려 있다'는 것은 단지 수용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로 원문과 번역의 차이, 번역가의 선택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사실 한국어로 쓰인 시조차도 즉각적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의 난해성보다는 독서 훈련 부족의 문제일 때가 많다. 외국 시의 번역본을 읽을 때는 두 겹의 필터 -원시와 번역- 를 통과해야 하므로 독자의 그릇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성복 선생의 번역 시집에는 브레히트, 프로스트, 첼란, 엘뤼아르가 등장한다. 이들의 시는 번역을 거쳤음에도 강한 이미지와 감정을 전달한다. 그것은 번역가의 솜씨와 독자의 태도가 빚어낸 작은 기적이다.
브레히트의 "아, 우리가 장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 우리가 왔을 때, 장미는 거기에 피어 있었다"라는 문장은 우연과 존재의 필연을 말한다. '내가 찾지 않았지만 어떤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서늘한 진실이 번역을 통해서도 잘 전해진다.
번역은 완전한 대체물이 아니다. 번역은 독자가 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문법이다. 그 새로운 문법을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독자의 몫이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 문화평론가)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