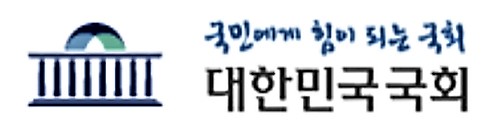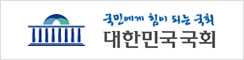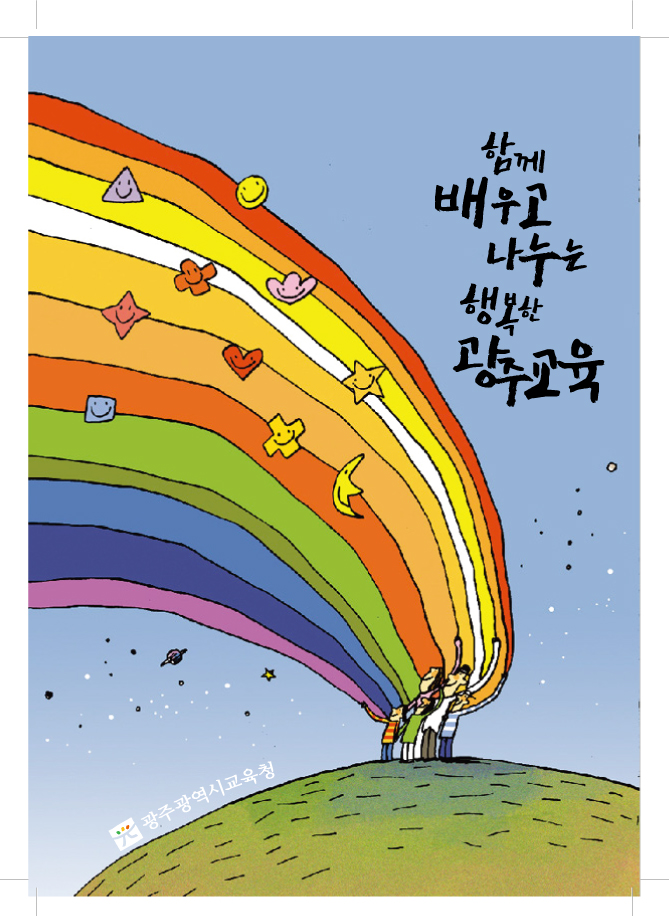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 자그마한 카페서점이 있다. 책 관련 단체들이 모여 '바람직한 독서 모임을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토론하는 모습을 본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투박한 아저씨도 둥근 탁자에 앉아 있다. 그들은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역사상 금서로 지정된 책도 토론한다. 우리에게 '금서의 시간', '금지 가요곡'의 시간은 군사 정권의 시간으로만 알았다.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 자그마한 카페서점이 있다. 책 관련 단체들이 모여 '바람직한 독서 모임을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토론하는 모습을 본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투박한 아저씨도 둥근 탁자에 앉아 있다. 그들은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역사상 금서로 지정된 책도 토론한다. 우리에게 '금서의 시간', '금지 가요곡'의 시간은 군사 정권의 시간으로만 알았다.아직도 이념을 이유로 도서를 검열하고 금서 목록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고개를 갸웃한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 읽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은 법이다. 독서 읽기에서도 금서라는 말은 읽기의 우선 호기심을 자극한다. 불온서적을 갖고 있기만 해도 감옥에 가던 시절 95%가 넘었던 청년층의 독서율이 최근 30%대로 떨어졌다. 그러고 보면 금서가 독서 읽기에 자극의 시간이 된다.
학인에게도 대학 시절 한 권의 금서를 만난다. <금강>이다. 창작과 비평에서 나온 책이다. 금강은 금서로 지정이 되자 더는 출판이 되지 않았다. 불온복제로 은밀히 전해지던 책이다. 대학생의 책가방을 전경이 뒤졌던 시절이다. 유난히도 대학가의 거리에는 전경이 많이 깔려있다. 금서를 가진 학생은 전경이 보이면 골목으로 피하기도했다. 마치 조선 왕조 시절에 피맛골의 전경(모습)과도 같았다. 우스운 것은 錦江은 한 자 제목이었다. 한자의 낯선 글자에 전경이 아무렇지 않게 위기를 넘어가는 예도 있었다.
금서를 보는 것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장했다. 도서관의 구석에서 떨리는 가슴으로 금강을 읽곤 했다.
지금도 <금강>이 누런 책으로 책꽂이 중심에 있다.
간밤에는 글 쓰는 작가 모임의 단톡방은 그야말로 불이 났다. 단톡방은 9시가 넘으면 단톡을 하지 않는 것이 규범처럼 지켜진다. 간밤에는 그러한 상식이 비상이 됐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외신과 국내 언론의 긴급 소식이다. 같은 뉴스인데도 너나, 나나 모두 올린다. 신문이 다르기에 기사가 조금씩 다르다 해도 노벨상 받는 사실은 같은 기사다. 그럼에도 선비들은 자신 일처럼 기뻐하며 늦은 시간의 카톡 소리를 즐긴다.
그런데 '스웨덴의 도서 온도'와 '한국의 도서 온도'는 다른 것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기도 교육청 도서 온도'는 다른 것일까.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자로 결정된 온라인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청소년 유해 작가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권고한 500여 종에 한강 노벨 수상자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사실이 논란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5월이다. 평론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이창래 '가족' 정재승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등이 포함됐다.
노벨상이 결정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독자의 글이 올라온다. 중국의 역사지만 분서갱유를 한 진시황, 수백 권의 책을 불태운 히틀러처럼, 권력이 수많은 책을 탄압했다. 그 탄압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이 ’책의 온도‘를 모르는 거라면 오늘이라도 서점에 나가서 늦기 전 책을 읽었으면 한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 문화평론가)
- 최창일 시인(이미지 문화평론가)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