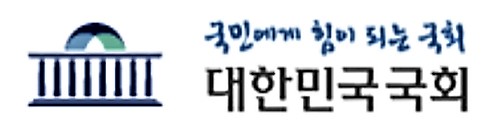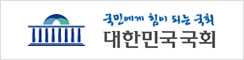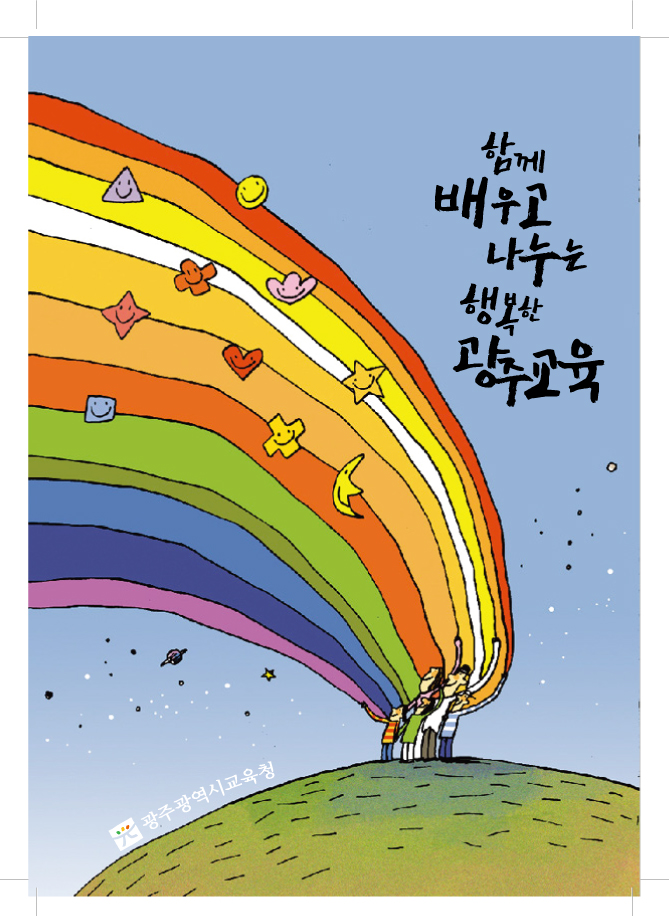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밤은 무엇으로 보세요". "밤은 고독의 시간이 아닐까요. 상상하건대 니체도 그렇고 괴테의 밤은 고독의 밤이 아니었을까요".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밤은 무엇으로 보세요". "밤은 고독의 시간이 아닐까요. 상상하건대 니체도 그렇고 괴테의 밤은 고독의 밤이 아니었을까요".묻는 사람이 바쁘게, 준비된 대답처럼 김 선생은 답을 준다. 밤이란 시간의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금을 그어주는 시간이다. 밤을 만든 신은 고민이 따랐을 것이다. 밤은 긍정도 크다. 못지않게 부정도 크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아리송한 말도 있다. 깊이 있는 말처럼 느껴 지지만 부정과 긍정의 뉘앙스다.
숲의 나무도 잠든 시간이다. 새들과 곤충도 밤이면 잠든다. 밤에 활동하는 새들은 드물다. 아예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모두가 숲의 침대에서 고요를 느끼며 깊은 단잠에 빠진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밤은 멈춤을 벗어나 그 속도를 더한다. 밤을 노래하거나 밤을 논한 글들은 많다. 고단한 사람에게 밤은 옷을 벗긴다. 근심도 보자기에 쌓아서 걸어둔다.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를 누이는 곳은 침대다. 침대의 시간은 환상이 겹치는 상상력의 시간도 보탠다.
상상력은 상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쓰다듬는 시간은 밤의 시간이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을 곧잘 한다. 꿈은 이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잠듦으로 나타나는 꿈도 있다.
우리 생의 반은 밤이다. 밤이면 보이는 꽃과 나무, 바람의 정령들과 친구도 된다. 어지러운 감정도 살아나고 서글픈 뒤꼍의 일들도 돌아와 나를 만지며 부끄럽게 한다. 그러다가 어둠의 고요가 주는 위로를 받는다.
밤은 말랑한 것 같다. 아니다. 아주 단단한 것들이다. 사람의 본성은 쾌락, 권력, 삶의 뜻, 창조적 욕구, 이런 것들로 형성되거나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추구한다. 그러한 시간은 밤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많다.
쉬어갈 때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 나를 낮추고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한다. 그것은 밤이 주는 혼자의 시간이다. 아니다. 혼자여도 혼자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다. 프랑스의 시인 앙리 미쇼(Henri Michaux, 1899~1984) 시인은 유달리 밤을 좋아하고 독자의 사랑을 받는 밤의 시를 만들었다.
’밤 속에서/ 밤 속에서/ 나는 밤과 한 몸이 된다./ 끝없는 밤/밤/ 나의 밤, 아름다운, 나의 밤//밤/ 탄생의 밤/ 내 외침으로/ 내 이삭들로/ 나를 가득 채우는 밤/ 나를 침략하고/ 넘실거리는/ 사방으로 넘실거리며,/ 짙게 피어오르는/ 소리 죽여 웃는 너는 / 밤// 누워 있는 밤, 냉혹한 밤./ 그리고 밤의 악단, 밤의 해안/ 저 높은 곳, 도처의 해안/그 해안은 마시고, 그 무게는 제왕,/ 모든 것은 그 아래 무릎을 꿇는다.// 그 아래, 실오라기보다도 더 가는/ 밤 아래/ 밤.‘
앙리 미쇼의 '밤 속에서' 전문이다.
앙리 미쇼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쥘 쉬페르비엘(Jules Supervielle, 1884~1960, 프랑스) 시인의 비서가 된다. 순전히 시가 좋아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밤의 시를 쓴다. '밤 속에서'의 시 외에도 ‘밤’과 같은 시를 발표한다. 가슴에 편안하게 도달하는 밤의 시인이다. 틈틈이 그림도 그리는 천상의 예술가다.
어찌 앙리만의 밤이겠는가? 오가다가메노스케와 같은 시인도 '밤이 쓸쓸해’'는 시를 만들어 독자의 머리맡에 두게 하는 시편들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가까운 시인들은 밤을 무던하게 사랑한 시인들이 있다. 정호승 시인, '무릎'도 밤의 예찬이다.
겨울밤은 유달리 한국인들의 밤이다. 군고구마가 익어가고 동치미가 긴긴 겨울밤의 친구가 된다. 밤은 천장을 보게 하는 재주가 있다. 실처럼 가느다란 까만 줄을 만드는 예술가다. 밤은 전등불을 만들게 하였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