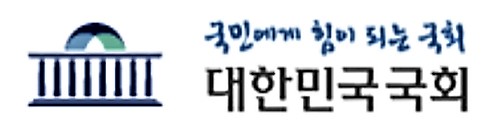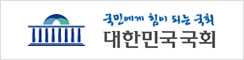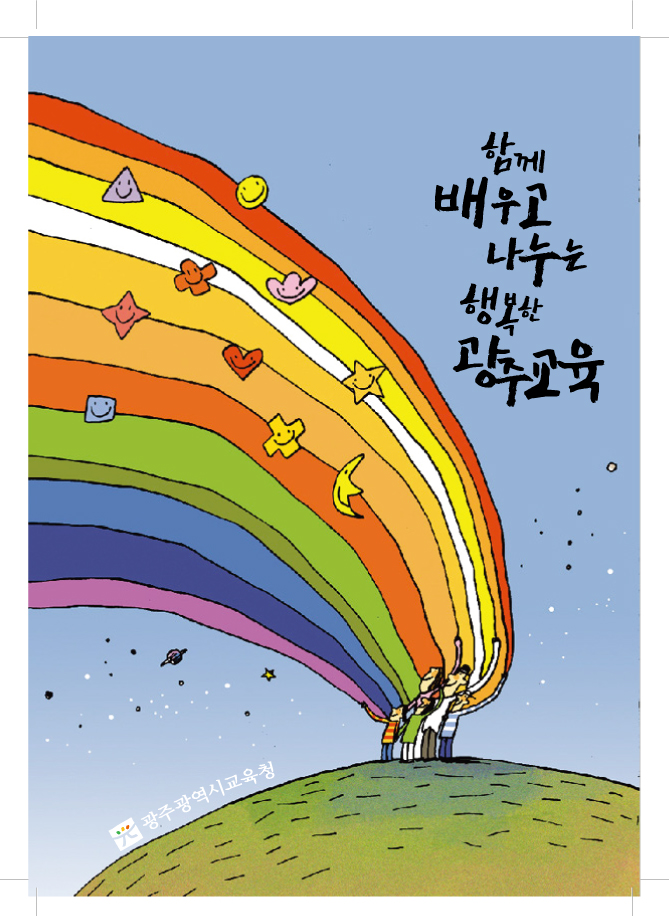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처서(處暑)를 지나면 나무들도 외출을 서둔다. 따가운 햇볕은 주눅이 들고 매미도 목쉰 소리를 내다가 그마저 자지러들고 만다. 기다렸다는 듯 귀뚜라미가 매미를 대신 노래한다.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처서(處暑)를 지나면 나무들도 외출을 서둔다. 따가운 햇볕은 주눅이 들고 매미도 목쉰 소리를 내다가 그마저 자지러들고 만다. 기다렸다는 듯 귀뚜라미가 매미를 대신 노래한다.가을의 행간을 일러준다. 아침 시간의 분주함을 아는 듯 간간이 쉬어가는 소리는 가을, 첫 줄을 밀고 당긴다. 분명, 지난해 구성지게 소리하던 소리꾼의 자제(子弟)가 맞다. 말없이 산방(山房) 떠난 스님처럼 여름옷 갈아입을 시간 찾아주었다.
노래하는 장소도 문간방 창문틀 근처다. 지난해 귀뚜라미가 그러했듯 올해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은둔의 가족이다. 소리에도 마음에 머무는 사유(思惟)가 있다. 길섶에서 만나는 풀꽃의 이야기 모아 남도창(南道唱)을 한다.
이 시간이면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야 할 시간이다. 아니면 '시간의 향기'를 꺼내어 커피의 시간을 가져볼까. 시몬 드 보브아르(Simone Beauvoir. 1908~1986)는 그랬지. 나는 가을이면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참회록'을 펼친다고 했다. 우리는 안다. 가을은 눈에 닿는 모든 것들이 걸작이 된다. 책 속에는 정신의 양식을 찾아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가을 나무들도 포도주를 마신 것일까. 얼굴이 붉어지고 기우뚱거린다. 나무도 그리운 사람이 있는 것일까. 구름을 향하여 한없이 붉은 휘파람을 분다.
가을은 느낌도 색으로 변한다. 그리워해야 할 사람은 그리워하자는 시구(詩句)가 좋기만 하다. 권일송 시인은 "가을은 햇살도 맛이 든다"라고 했다. 그렇다, 가을은 모두가 홍옥의 사과처럼 무르익는 시간이다.
고산(高山)의 나무들도 수상하다. 분명 무슨 일인가 저지를 것만 같다.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무섭고 두렵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왜 저렇게 오색의 천연색들만 널려있을까. 가을은 모든 것들이 두근거린다. 두근거리는 것은 외로워서 일 것이다.
노을빛이 영락 여인의 손수건이다. 모래밭 걷는 새들도 붉은 발자국이다. 발자국 찍힌 자리에 붉은 빗소리가 들린다. 숨이 넘어갈 한계점까지 걷고 싶다. 부서지는 파도가 노을을 만나서 노래한다. 그대는 부서지기 위해 태어났는가. 긴 그림자를 그리며 산으로 오른다. 나뭇가지는 매달린 바람과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산등성이에 걸터앉는다. 나뭇가지를 건드리면 붉은 종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그려가는 곡선이 아름답다.
푸른 시간을 움켜잡기에는 늦은 시간이다. 일그러진 계절의 바람이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계절은 속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다. 시들시들한 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가 죽었는지 계절만이 알 일이다. 숲속도 여울물도 뭔가 심상치 않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변한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가을은 창문을 닫고 미명의 묵상을 하는 시간. 영원을 이어주는 존재의 의미를 새겨본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면 신은 가을을 그리는 화가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꿈꾸고 갈망하는 행복이 있다. 계절은 가을이 행복이다.
화가 르누아르(Renoir. 1841~1919)는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IL faut embellir)." 그가 말년에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에게 남긴 이 한마디는 르누아르의 예술세계를 단적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그의 예술철학을 대변하는 말이다. 화가는 행복을 화폭에 담는 것이다.
계절은 결실의 열매를 담는다. 싸늘한 늦가을 바람이 넘어서면 빨강, 노랑 분꽃은 마지막 나팔을 분다. 분꽃의 나팔 소리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먼저 참회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오늘은 시애틀의 친구로부터 엽서가 왔다. 시애틀의 가을을 유난히 늦는 모양이다. 계절상 지금쯤이면 여느 때처럼 바닷가 근처부터 단풍이 붉게 물들고 비는 더 자주 내려야 하는데. 계절의 난동으로 여름의 끝에서 멈추어선 단풍은 영글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의 가을이 그립다는 엽서다. 단풍이 들기 전 앙상해 버리는 시애틀의 가을엽서 소식이 아쉽다.
한국의 귀뚜라미 소리와 가을의 단풍 소식을 동영상으로 친구에게 보낸다. 마음을 끓이는 시간이다.
 - 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
- 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