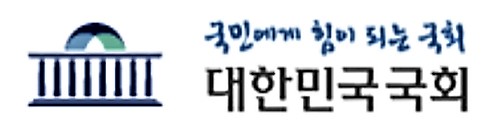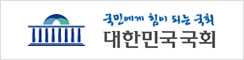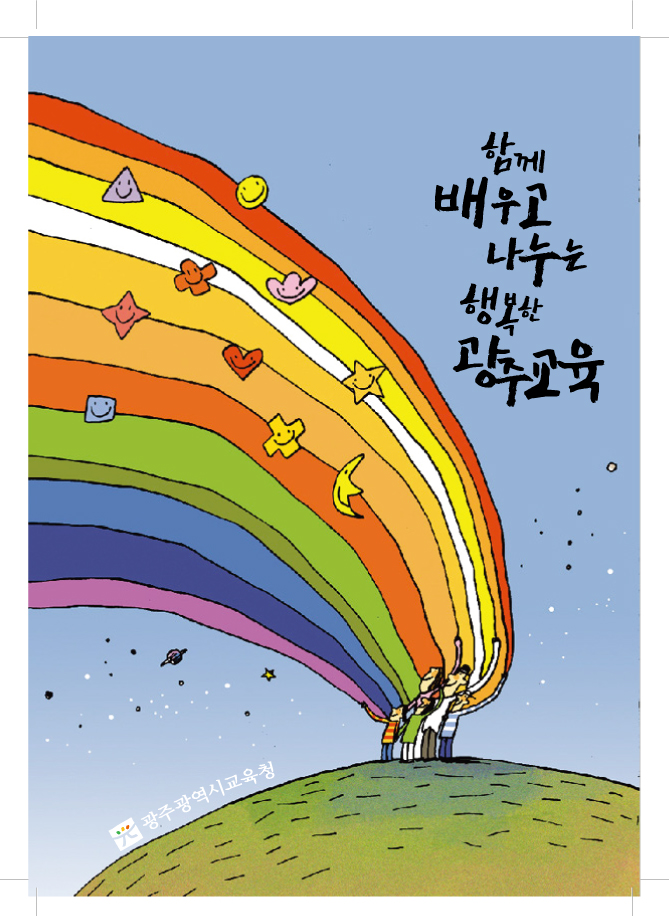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창을 열자. 창을 열고 햇빛이 쏟아지는 봄의 은총을 마시자. 모멸의 추위는 갔다. 성가신 시간들이 멀어져 간다.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창을 열자. 창을 열고 햇빛이 쏟아지는 봄의 은총을 마시자. 모멸의 추위는 갔다. 성가신 시간들이 멀어져 간다.따뜻한 오후, 성곽 길의 흙냄새가 정겹다. 사실 흙냄새라기보다 세월의 냄새라고 해야 할 것이다. 600년 전에도 미세한 실바람이 담벼락을 긁었고, 허공의 구름을 징검다리 삼아 유영의 새들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놀고 있다.
걷다가 멈춰서 그 성곽 길에 등을 기대면 벽 안으로 스며들었던 역사의 기억들이 들리는 듯. 홀로 걷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으로 인사하듯 역사의 음성이 들린다. 성곽을 쌓던 토목기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성곽 돌의 홈을 만지고 들여다본다.
한참을 걷다보니 낙산공원의 팻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낙타의 등 모양으로 다닥다닥 모여 살았던 곳. 봄날 꿈을 보자기에 쌓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던 소녀들의 미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곳은 지금도 가난한 미싱사들이 맥을 이어가며 살고 있다.
10여명 중년의 남녀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다. 40을 넘긴 해설사가 낙산의 스토리를 들려준다. 슬그머니 그들의 대열에 끼어 낙산의 역사를 듣는다.
2006년 '낙산 공공 미술 프로젝트' 작업 덕분에 지금은 마을 전체가 미술관이다. 간혹 조각을 하는 장인의 피를 이은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장도 있다.
예술은 삶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는 법. 아직도 이곳은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맥을 이어간다. 간신히 버티는 탁자위에 오래된 가스버너 뒤로 커피 500원 모과차 1000원이라는 글씨가 차라리 추사체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인다.
닭 모양의 조형물이 나오고 빛이 바랜 조각들이 계단을 오르는 곳마다 눈길을 잡아끈다. 배우이자 뮤지션인 이승기가 사진을 찍었다는 천사의 날개가 반쯤은 퇴색이 되어 있다. 날개 앞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남긴다. 눈 위에 집들이 있고 눈 아래 집들이 가득 차 있다.
젊은이들이 내려다보며 나누는 말엔 허무의 한숨이 들어 있다. "저 많은 집들 사이에 내 집은 아직 없다"는 말이 왠지 서걱거리는 갈대의 바람소리가 들린다. "형, 형이 잘되면 저런 낙타 등의 집이 아니고 성북동의 높은 아파트에 살겠지", "형이 잘되면 나도 아파트에 살지 않겠어?"
두 사람의 관계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한국의 주택정책이 저들에게 좋은 주거를 만들 수 있을지 가 궁금해진다.
성곽의 안내판에는 성곽을 오르지 말라는 안내다.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여름이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성곽에 올라 사진을 찍는다. CCTV는 그들을 감지하고 성곽에서 내려오라는 경고를 한다고 한다. 여름에 서울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한다.
오래된 앨범을 보는 듯하다. 낙산의 정상에서 가로질러 대학로로 내려간다. 골목에 마주친 빛이 바랜 그림들을 보며 이화 주민센터를 지나면 '이화장'이 나온다. 이화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 후 8개월 정도 살았던 곳이다.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구성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안내판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낙산을 걷다보니 고재종 시인의 '파안'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얼굴을 부드럽게 하여 활짝 웃는 것이 파안이 아니던가.
주막에 나가서/ 단돈 오천 원 내놓으니/소주 세병에/ 두부찌개 한 냄비/ 쭈그렁 노인들 다섯이/ 그것 나눠 자시고/ 모두들 볼그족족한 얼굴로/ 허허허/ 허허허/ 큰 대접받았네 그려! 성곽의 유려한 선을 걸었으니 나도 파안의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한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
- 최창일 시인(이미지문화학자, '시화무' 저자)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