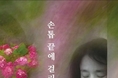(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년 8월 28일~1832년 3월 22일)가 사랑한 카페가 문을 닫는다. 259년 된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 '카페 그레코'(Caffe Greco)다.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년 8월 28일~1832년 3월 22일)가 사랑한 카페가 문을 닫는다. 259년 된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 '카페 그레코'(Caffe Greco)다.괴테는 수많은 나라에 여행을 했다. 동양의 여행 중에는 한국의 은행나무를 옮겨가 정원에 심고 단풍에 매료되어 파티를 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괴테가 세계를 여행 하며 눌러 앉은 곳은 유일하게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괴테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괴테는 로마거리, 비아 콘도티에 있는 '카페 그레코'에 생각과 같이 앉곤 했다. 카페는 괴테에게 생각의 자락과 대화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괴테의 천재성을 일깨운 삶의 일대 전환적 기록 <이탈리아 여행기>(1786~1788)를 만들기도 했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기록, 서신, 보고(報告)의 다양한 양식의 글들이다. 여행기를 찬찬히 보면, 괴테가 품었던 예술에 대한 이상과 열정 등을 엿보게 한다.
1970년대에 문을 연 이 카페는 스탕달, 찰스 디킨스, 오슨 웰스, 안데르센 등 수많은 문인 지식인들이 모여 토론을 하던 당대 최고의 문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토론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세계적 문호의 반열에 들지 못한 셰익스피어가 괴테에 의해 재발견 된 토론의 장이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며 생각하면 ‘카페 그레코’가 사라진다는 것은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한국이 명동의 예술극장(1934년 창립)을 지켜내듯 이탈리아의 정부의 태도를 눈여겨 지켜볼 뿐이다. 그러한 문제는 비단 이탈리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C시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카페 그레코'를 방문하는 것이 찰나(刹那)의 기억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쉽다. 유서 깊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의 향기가 괴테와의 인연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당시 동행의 가이드는 건물주인 이스라엘계 병원이 월1만8000유로(약2366만원)였던 임대료를 갑자기 12만 유로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소식을 귀 뜸해 주기도 했다.
'카페 그레코'가 자리한 콘도티는 루이비통과 샤넬, 구치 등 명품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쇼핑가다. 당시에 프랑스 명품브랜드 몽클레르가 카페자리 인수에 거론이 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는 늘 이렇게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의 현실도 이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는 황금찬(1918~2017) 시인이 즐겨 다닌 '사르비아' 다방이 있었다.
황금찬 시인은 혜화동 로타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에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정년을 했다. 황 시인의 집은 수유리에 있었다. 황 시인과 약속 하면 '사르비아' 다방에서 보자고 했다. 정년을 한 황 시인은 마땅히 작업실이 없었다.
'사르비아' 다방은 황 시인의 접견실 구실을 했다. 그래서인지 황 시인은 평소에 '사르비아'라는 시를 쓰기도 했고 '사르비아' 꽃을 가장 좋아했다. 지금은 '사르비아' 다방의 상호는 사라지고 유명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사르비아'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투스(Lotus)라는 달착지근한 과자가 나온다. 황 시인은 커피와 로투스 과자를 같이 먹으면 커피 맛이 좋아 진다며 소박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카페와 문인은 매우 밀접한 공간이다. 한국의 문인은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약속이라도 한 듯, 최인욱 소설가와 박목월, 조지훈, 황금찬 시인은 부산의 카페에서 조우하는 기록들이 있다. 다시 서울에 올라와 명동의 다방과 남대문에 있는 문예빌딩의 지하 문예살롱은 문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지금도 많은 문인들은 인사동의 여러 카페를 아지트 삼아 모여 든다. 물론 옛날의 모임과는 다르다. 시낭송이나 세미나를 하고 뒤풀이의 성격이 크다. 천상병 시인의 시 제목을 차용한 <귀천>은 대표적인 공간이다.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의 박인환(1926~1956) 시인의 명작들이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나왔다.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작가에게 참으로 유복한 시절이다.
함동선 시인은 대학로에 창작의 공간이 있다. 이어령, 이문열, 이외수와 같은 현역 작가들은 넓은 공간의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모든 작가에게 고르게 주어진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작가에게 문학적 공간은 한국의 발전된 경제를 대변한다.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생각은 순간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토론이라는 과정에 나온다. 생각은 습관이 된다. 그러한 생각의 산실이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것은 괴테가 사랑한 '카페 그레코'가 증명하고 있다.
- 최창일(시인·이미지문화학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