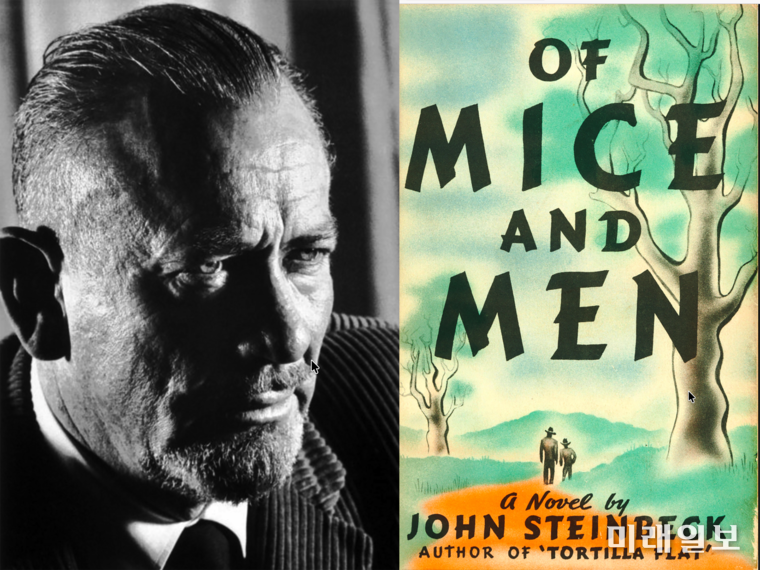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존 스타인벡의 <생쥐와 인간>은 두 명의 떠돌이 노동자로 시작된다. 영리하지만 가난한 조지와, 힘은 세지만 지적 장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레니. 그들을 묶는 것은 혈연도 계약도 아니다.
"언젠가 우리만의 작은 농장을 갖자"는 약속, 그 단순한 미래의 문장이다. 거기서 레니는 토끼를 기르고, 조지는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 쉽게,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진다. 레니의 통제되지 않은 힘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고, 조지는 선택의 벼랑 끝에 선다.
소설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는 존재했는가.
이 지점에서 <생쥐와 인간>은 단순한 대공황 소설을 넘어선다. 작품이 집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가난의 풍경이 아니라, 불황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파괴하는가 하는 문제다.
1930년대 미국에서 사라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권리였다. 안정된 노동이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은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존재가 된다. 상실된 것은 소득이 아니라 미래이며, 미래의 상실은 곧 존엄의 유예를 뜻한다.
조지와 레니가 꿈꾸는 작은 농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화려한 변주가 아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권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다. 그러나 대공황의 사회는 이 소박한 욕망조차 수용하지 못한다. 그 꿈이 좌절되는 이유는 허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스타인벡의 날카로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데 있다. 레니의 행동은 직접적 원인이지만, 소설은 그것을 설명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질문은 이후에 남는다. 왜 이 사회에는 레니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는가. 왜 돌봄의 책임은 오직 조지 개인에게만 떠넘겨졌는가. 이 비극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이, 침묵 속에서 선명해진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대공황은 역사 속 사건이 되었지만, 불안정한 삶의 조건은 다른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다. 계약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라는 말들은 유연함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서사는 반복되지만, 실패의 책임은 더욱 철저히 개인에게 귀속된다. 떠돌이 노동자들의 불안은 오늘 청년 세대의 불안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소설 속 고립의 장면들 또한 현재형이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크룩스,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한 컬리의 아내는 공동체 안에 있으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과거의 차별을 고발하는 동시에, 연결을 말하면서도 배제를 구조화하는 현대 사회의 은유로 읽힌다.
조지의 선택이 여전히 논쟁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자비였는가, 폭력이었는가. 보호였는가, 체념이었는가. 스타인벡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약한 존재를 끝내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선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질문은 오늘 더욱 불편하다. 우리는 효율과 경쟁을 미덕으로 삼는다. 돌봄은 비용이 되고, 연대는 비효율로 밀려난다. 그 결과 구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개인의 윤리로 전가된다. 조지의 비극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는 사랑했지만, 사회는 그 사랑이 지속될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조지와 레니가 끝내 함께 꿈을 꾸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꿈은 실패하지만, 함께 미래를 상상한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다. 스타인벡이 남긴 희망은 성공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말해보는 행위,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믿음이다.
<생쥐와 인간>은 묻는다. 불황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성취의 신화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존재들의 존엄을 보호할 것인가.
대공황의 소설이 다시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이 작품은 과거의 문학이 아니다. 불황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오래된 현재형의 경고다.

- 최창일 시인(이미지 문화 평론가)
i24@daum.net
